┃ 담뱃갑 건강경고, 담배의 진실을 마주하는 최고의 장치 ┃
담뱃갑 건강경고,
담배의 진실을 마주하는
최고의 장치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2002년, 한때 한국을 뒤흔들었던 국민 코미
디언 이주일 씨가 출연한 금연 광고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엄청난 애연가였던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통해 흡연의 안 좋은 점을 증언하고, 그로 인해 말년에 폐암으로
고통 받는 일상을 공개해 금연을 권장하는 광고였다. 광고에 드러난 흡연자의 폐암
투병 장면과 진심어린 호소는 많은 이들을 금연으로 이끌기도 했다.1)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실제 흡연 피해자가 등장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를 또 한 번 진행했다. 2012년
미국에서 진행된 팁스(Tips from former Smokers, Tips) 사례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32년간의 흡연으로 구강암에 걸려 혀의 3분의 1을 잃은 55세 남성이 출연해 증언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 광고의 경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의견과 환부가 드러나
다소 혐오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2)
우리나라 담뱃갑에도 약간은 혐오스럽고 적나라할 수도 있지만 담배로 인한 건강
폐해를 알리기 위한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비병변(병변이
아닌) 사진과 이에 상응하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
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이라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담배규제 정책 중 하나로,
현재 11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포장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
해야 하고, 경고그림은 30%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가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금연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로 이미 입증되었다. 흡연자의 58%는 경고그림으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응답했고,3) 청소년들 역시 경고그림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인식한 이가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다.4) 뿐만 아니라 경고그림과 문구로 인한
금연시도와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많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로 인해 금연을 시도하거나 성공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담배회사들은 어떻게든 경고그림과 문구를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담배
케이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담배 케이스는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시작된 직후인 2017년
2월, 직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0%나 증가했다. 실제로 흡연자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줄 알았는데, 담배를 피울 때 혐오스러운 사진이 눈에 상당히 거슬
려서 담배 케이스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일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는 흡연자의 심리를
고려해 경고그림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담배를 뒤집어 진열하는 곳도 있다.5)

< 드라마 ‘시카고타자기’ >
이러한 담배 케이스는 미디어에서도 많이 노출된다. 여기에는 담배 케이스를 고급화
시키려는 시장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총 16부작으로
인기리에 막을 내린 tvN 드라마 ‘시카고타자기’를 보자. 극중에서 스타작가로 나오는
한세주(유아인)에게 낡은 타자기가 배송되고, 이후 자꾸만 나타나는 환영에 패닉에
빠진 그는 담배 케이스를 찾아 담배를 입에 문다. 이 과정에서 경고그림은 일절 보이지
않지만, 담배 케이스는 그 전면이 방영된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빼고 담배 브랜드 명만 미디어에 노출되는 장면도 많다. 웹툰
‘복학왕’에서는 주인공이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우는데, 담배 브랜드명과
광고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경고그림과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어느 한 작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웹툰의 34%에서 나타났다.6) SNS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SNS에서는 흡연 장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어려워서 담뱃갑 사진
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대부분의 담뱃갑 사진은 경고그림이 삭제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어 담배의 유해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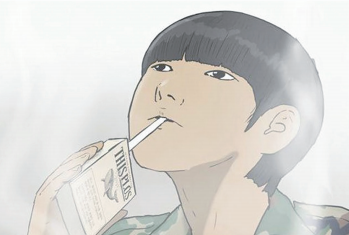
< 웹툰 ‘복학왕’ >
최근에는 담배 스티커도 등장했다. 아예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제작
되는 스티커에는 하루를 위로하는 감성문구나 캐릭터, 일러스트 등이 그려져 있다. 담배
주요 판매처에서는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담배를 엎어놓고, 뒤집어 놓는 등,
다양한 판매 전략까지 등장했다. 담배업계에서는 술병에는 유명 연예인의 광고가
붙어있는데, 왜 담뱃갑에만 암환자 사진을 붙여야 하느냐는 반발을 하고 있다.8)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경고그림은 혐오스러울 뿐, 금연에 큰 효과는 없다고 주장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고그림의 효용성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뤄진 연구와 정책
으로 그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이다.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흡연자의 57%가 경고그림이 금연 동기를 유발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18개국
에서 시행하고 있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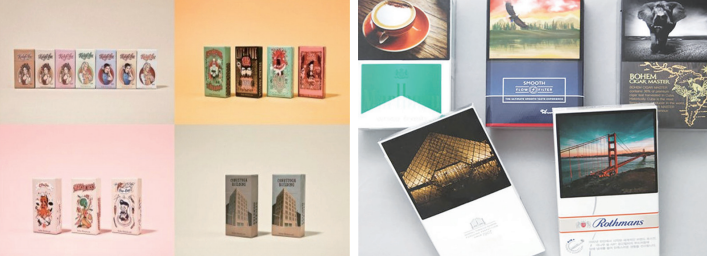
< 소셜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 스티커 제품들 >
국내에서도 2016년 말 첫 시행 이후 2017년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7년에 공개한 설문조사
에서도 성인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 결심을 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비흡연 성인의 81.6%, 비흡연 청소년의 77.5%가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응답했다.10) 현재 우리나라는 담뱃갑의 50%만 경고그림으로 채워 넣고 있지만, 일부 국가
에서는 담뱃갑의 90% 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한 곳도 있고, 담뱃갑을 무광고로 규격화
해서 판매하는 국가도 여럿 있다.11) 이에 우리나라도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확대하고, 나아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듯,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대중들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담배로 손을 가져가는 이들이 많다. 흡연자들 대부분은 담배가 몸에 해롭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 채 흡연을 하고 있다. 담배의 폐해를 애써
잊어보려는 흡연자들에게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진실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는
최고의 장치이다.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외면하는 대신 담배 자체를 멀리한다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 MBC 뉴스 보도자료. (2002.12.27.). “[연말기획] 되돌아본 2002, 이주일 폐암 금연열풍 거셌다.”
2) THE PR뉴스 보도자료. (2017.01.13.). “미국서 효과본 증언형 금연광고, 한국은 약하다?”.
3) Canadian Cancer Society. (2001). Evaluation of new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Focus Canada 2001–3.
4) 김보라, 권영주. (2019). 담뱃갑 경고그림이 청소년 흡연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3(1), 129-153.
5) 조선일보 보도자료. (2017.02.10.). “담뱃갑에 ‘혐오그림’ 싫어... 담배 케이스 인기 폭발”.
6) 동아일보 보도자료. (2018.05.10.). “청소년 즐겨 보는데... 담배 문 웹툰”.
7) 서강대학교, 보건복지부. (2018). 디지털 미디어 속 흡연 장면 실태파악과 콘텐츠별 청소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제언.
8) 매일경제 보도자료. (2016.4.11.). “담배업계, 술병엔 연예인, 담뱃갑엔 암환자... 차별 커”.
9) 대구대학교. (2017).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흡연자의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
10) 경향신문 보도자료. (2017.6.29.). “혐오스러울수록 경고 효과도 높다... 담뱃갑 경고그림 설문조사”.
11)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8.2.14.).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있다 VS 없다... 세계의 목소리는?”.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인 : 조인성 | 기획·총괄 : 김수영, 박경아 | 구성·집필 : 박은희, 김지현
발행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Copyright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ll rights reserved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 TEL 02-3781-3500 | FAX 02-3781-2299
Copyright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ll right reserved.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 TEL 02-3781-3500 | FAX 02-3781-2299
Copyright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ll right reserved.